정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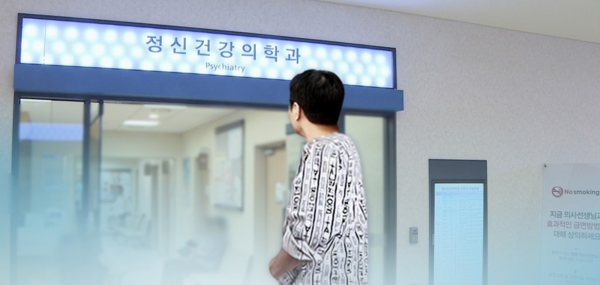
작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 등으로 실시된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신병원 격리나 강박 지침이 현장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점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 따라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부의 격리·강박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저 의료기관 간 격리·강박 환자 수 차이가 최대 861명·943명에 달해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의 시행원칙을 어기고 격리·강박을 남용한 것이 의심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침에 따른 연속 최대 시행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 초과 사례가 있는 기관이 전체의 14.7%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 수가 1개 이상인 기관도 전체의 24.7%에 달해 지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사례와 상반됐다. 미국은 격리·강박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의료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대체 치료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또 격리·강박 관련 사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연방 보험청)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간호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었다.
연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은 격리·강박의 대체 기법 등을 포함하는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을 개발, 보급했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이 제시됐다. 충분한 의료인력은 안전한 격리·강박의 시행, 격리·강박의 빈도 감소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격리·강박 중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현행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제안됐다.
비강압적 치료법 개발·보급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